명절 제사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추억속에 빠져 봅니다. 제가 어릴때는 누구집에 제사가 있다고 하면 그날은 동네 아이들이 모이는 날이였습니다.
십여가구가 전부인 산골마을에 누구집 제사는 기름진 음식을 맛볼수 있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형,누나,동생 할꺼없이 모여서 누구집 제사가 끝날때까지 별의별 게임을 하면서
제사가 끝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집 제사가 빨라야 밤11시 늦는집은 새벽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9시만 넘어가면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그때부터 졸음과의 전쟁이 시작 됐습니다.
지금이야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서 뭘해도 되지만 그때는 잘해야 화투치기 인데 그것도 동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겨우 눈가리고 술래잡기나 이불덮고 전기가기 또는 무서운 이야기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밤11시가 지나기 시작하면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두명씩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고 결국은 제삿밥도 못먹고 남의집에서 쪽잠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구력이 남다르거나 원래 잠이없는 올빼미족 몇몇이 큰 양푼을 들고 제삿집에 찾아가면 제삿상에 올랐던 음식을 조금씩 나눠서 담아 줬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돌담길을 더듬거리며 받아온 제삿밥은 그야말로 꿀맛이였고 버텼다는 성취감은 개근상도 못받아본 시골촌놈의 목뼈에 기부스가 되어 한동안 이전과 다른 공기맛을 맛보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헛 제삿밥이 별미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情이였고 놀이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이 조금은 야속한 가을밤에 촌놈은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제삿밥 추억속에[3]
제삿밥 추억속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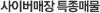










































그런 추억이 있었죠.
0/2000자